[2026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마트료시카 / 배종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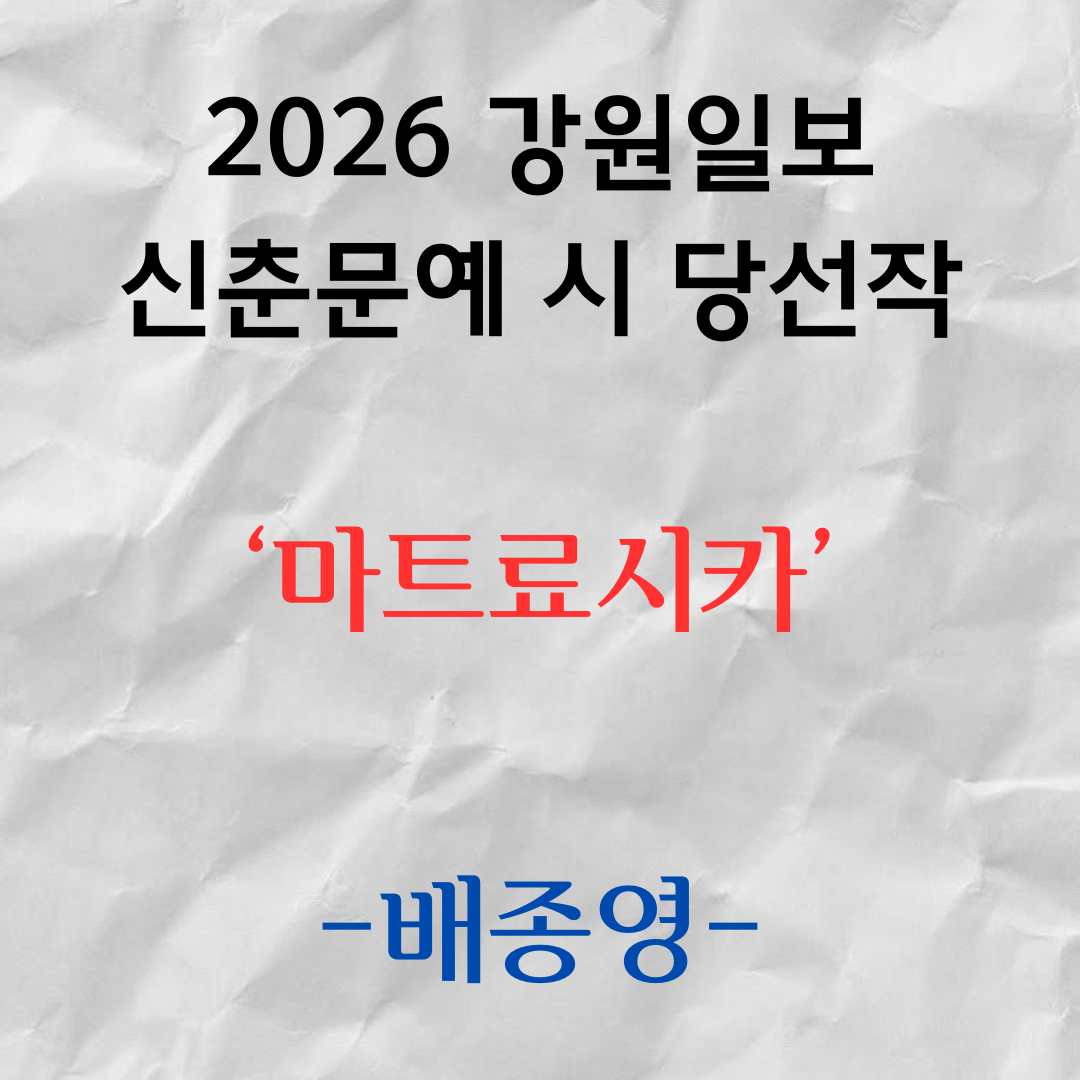
<당선작>
마트료시카 / 배종영
열 달 동안이나
엄마 속에 있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엄마를 모른다
그런데 엄마는
고작 열 달 동안 안고 있었음에도
나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다
막연,
그렇게 막연은 배운 것 같다
세상이 천애(天涯)의 무인도 같을 때도
엄마가 목선 한 척 노 저어
내게로 올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그 믿음은 늘 편도여서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지 내가 다가간 기억은 없다
없는 곳이 없는 엄마,
나는 늘 그 엄마의 가없는 믿음이었지만
한 번도 그 믿음, 되돌려준 적이 없었다
인형 속에 똑같은 인형들이 겹겹이 들어 있는 마트료시카
몇 겹의 엄마를 벗기고 벗겨 나를,
막연한 나를 두었다
엄마 속엔 늘 엄마와 똑같은 엄마가 겹겹이 들어 있었지만
나는 늘 그렇게 홑겹이었다
엄마는 엄마 속에 엄마를 숨겨놓고
혹시나 그 엄마 닳아 없어질까,
내어 줄 엄마가 다 떨어질까 전전긍긍했다
나는 지금껏 도대체
몇 명의 그 엄마를 우려먹고 살아온 것일까
엄마를 떼어낸 내 몸의 흉터들
어느 날 문득 그 흉터가
저릿저릿 저려온다
지금은 아무리 엄마를 열어 보아도
엄마 속엔 거듭된 손길의
그 엄마가 없다
*마트료시카 : 나무로 만든 러시아의 전통적인 인형으로 안에 작은 인형이 몇 개씩 들어 있다.
<당선소감>
-
어떤 면에서 사람과 사람은
법(法)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혀있는 일을
차근차근 풀어내는 법을 공부한 일로
가족을 부양했지만
늘 사물과 사물 사이에서 식물과 절기,
나무와 숲 사이에서
멍하니 사유하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뒤늦은 공부는 즐거웠다.
여름나무와 겨울나무, 그 사이에
별자리들이 깃들었다 간다는 것도 알게 됐고
한 무더기 꽃다지에도 순차가 있으며
내 어머니의 마음과 내가
참 많이 닮았다는 것도 시를 쓰면서 알아냈다.
어느덧 내 말투는 식물을 닮아갔고
고집스레 내세우던 입장들은 자주 주춤거렸다.
그러한 일엔 늘 아내의 간절한 조언이 섞여 있었다.
어느덧 이룰 수 있는 모든 가족을
다 얻은 나이가 되었지만
잃어버린 가족들도 그에 못지않다.
그중 내 어머니를 생각하면
두 손을 모으게 된다.
평생의 기원을 허락해 주신 강원일보와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시작(詩作)을 약속드린다.
● 경남 창녕 출신
● ㈜ 감정평가법인 대교 재직
<심사평>
-
최종까지 남은 작품은 이종현의 시 「백양 홍氏 규철이의 출생기」, 서준호의 시 「마음발자국」, 배종영의 시 「마트료시카」 등이다.
이종현의 시 「백양 홍氏 규철이의 출생기」는 한적한 역에 버려진 한 장애아가 역이름을 딴 성씨의 시조가 되는 과정을 코믹하고도 씁쓸하게 그린 작품으로, 내용의 특이성과 공들인 스토리 전개 과정이 눈길을 끌었으나 표현의 섬세함과 구성의 밀도가 아쉬웠다.
서준호의 시 「마음발자국」은 “동짓밤 우리가 내리던/그 눈을 우리는 기억하나요”라는 첫 구절이 보여주듯, 최종심에 오른 작품 중 시어와 리듬이 가장 젊고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앞으로도 이 감각을 잘 살리면서 시의 완성도에 좀 더 공을 들인다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다.
당선작으로 선정한 배종영의 시 「마트료시카」는 러시아의 전통 인형을 소재로 삼아 상상력을 펼쳐나간 작품으로, 낮고 지극한 목소리를 통해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로 형성해가는 능력이 돋보였다. 소재의 특성을 주제와 결합하여 나가는 과정도 담백하면서도 흡인력이 있었다. 함께 응모한 작품들 전체에서 오랜 수련이 느껴지는 형성력과 시의 매력 중 하나인 지극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큰 신뢰를 주었다.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낸다.
심사위원 : 이영춘·이홍섭 시인
<AI와 함께하는 작품 분석>
작품이 건네는 정서의 중심
이 시는 “엄마를 모른다”는 고백에서 시작해 “엄마 속의 엄마가 없다”는 상실로 끝난다. 관계의 비대칭이 핵심이다. 나는 열 달을 ‘엄마 안’에서 보냈지만 엄마를 다 알지 못한다. 엄마는 열 달을 ‘나를 안고’ 보냈을 뿐인데도 나를 다 안다고 말한다. 여기서 시는 모성의 신비를 찬양하기보다, 내가 기대고 소비해온 사랑의 무게를 뒤늦게 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미지와 비유가 하는 일
마트료시카
마트료시카는 ‘겹겹이 숨겨둔 엄마’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다. 엄마 속에는 또 다른 엄마가 들어 있다. 돌봄이 닳아 없어질까 두려워 예비의 엄마를 계속 준비해온 것처럼 보인다. 반면 “나는 늘 그렇게 홑겹”이라고 말한다. 내가 가진 사랑과 책임은 얇고 단순했다는 자책이 담긴다.
편도(편도여서)
“엄마가 내게로 올 것이라는 믿음”은 늘 편도라고 말한다. 엄마 쪽에서 오는 길만 있고 내가 다가가는 길은 없었다는 고백이다. 사랑을 주고받는 왕복이 아니라 일방향의 구조였다는 인식이 시의 죄책감을 만든다.
흉터
“엄마를 떼어낸 내 몸의 흉터들”은 돌봄을 ‘피부에 붙은 것’처럼 느끼게 한다. 사랑은 따뜻한 기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존의 흔적이기도 하다. 그 흉터가 “저릿저릿 저려온다”는 표현은 후회가 감각으로 되살아나는 순간을 정확히 잡는다.
정서의 흐름
- 무지의 고백
“열 달 동안이나… 여전히 엄마를 모른다”로 출발한다. 친밀함이 곧 이해가 아니라는 진술이다. - 비대칭의 확인
엄마는 나를 다 안다고 말한다. 여기서 화자는 사랑의 능력치가 한쪽에 몰려 있음을 본다. - 막연함의 정의
“막연은 배운 것 같다”라는 구절이 중요하다. 화자는 엄마를 통해 배운 것이 ‘확신’이 아니라 ‘막연한 믿음’이라고 말한다. 엄마는 항상 올 것이라는 믿음이다. - 겹과 홑겹의 대비
엄마는 겹겹이 준비하고, 나는 홑겹으로 기대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감정이 가장 날카롭게 뒤집힌다. - 소비의 자각
“몇 명의 그 엄마를 우려먹고 살아온 것일까”에서 죄책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사랑을 당연하게 쓴 시간에 대한 반성이다. - 상실의 도착
“지금은 아무리 엄마를 열어 보아도… 그 엄마가 없다”로 끝난다. 더 이상 ‘꺼내 쓸 엄마’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살아 있음의 거리, 혹은 죽음의 부재가 동시에 읽힌다.
시어가 만들어내는 목소리
- “막연”을 반복해 말하는 방식이 담담함을 만든다. 대성통곡 대신 낮은 자책으로 감정을 끌고 간다.
- “전전긍긍”, “우려먹고” 같은 일상어가 섞여서 죄책감이 현실적으로 들린다.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고 생활의 말로 고백한다.
- 결말의 “거듭된 손길”은 엄마의 사랑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 노동이었음을 드러낸다.
한 문장 해설
이 시는 엄마의 사랑을 무한한 자원처럼 써온 내가, 그 자원이 다했음을 깨닫는 순간에 생기는 통증을 “마트료시카”라는 겹의 이미지로 보여준다.
'좋은 글 > 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끈끈한 가족 / 최윤정 (0) | 2026.01.03 |
|---|---|
| [2026 경남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사과가 맛없을 때 / 김미월 (1) | 2026.01.02 |
| [2026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졸업반 / 김남주 (0) | 2026.01.02 |
| [2026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졸업반 / 김남주 (0) | 2026.01.02 |
| [2026 경인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나비 / 김밀아 (0) | 2026.0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