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중력의 힘 / 황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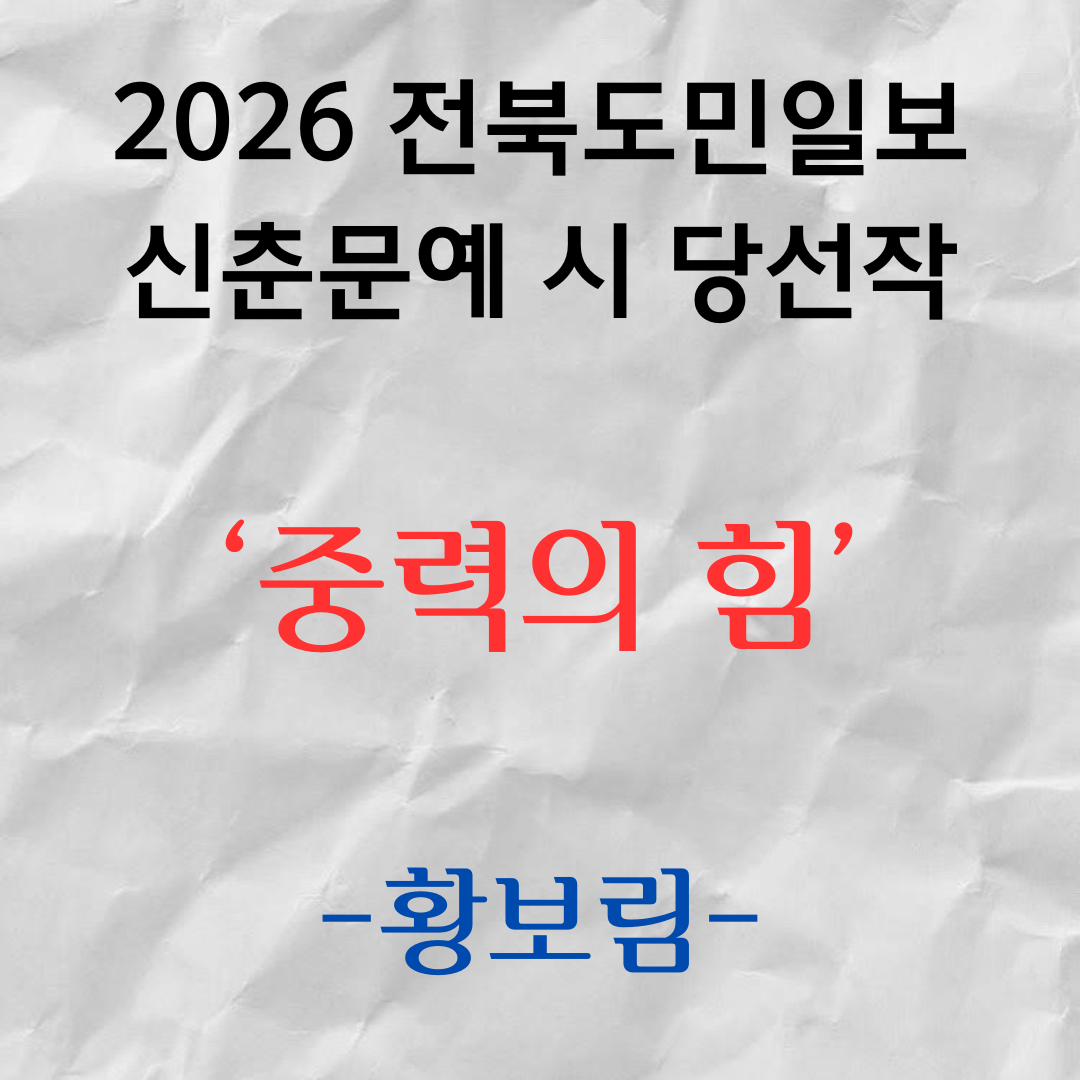
<당선작>
중력의 힘 / 황보림
벽시계 추처럼
끊임없이 움직여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터득한 듯
코끼리 코가 좌우로 물체를 감지하고 있다
물렁물렁한 살덩이가 때로는 철심처럼 튼실하게 중심을 잡는다
불어 닥치는 바람 한 줄기도 거침없이 말아 올리는 촉수
태엽은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수단이다
억센 풀밭을 헤집으며 작은 풀 하나도 능숙하게 뽑아내는 것은
늘 바닥을 직시하는 긴 코의 연륜 때문이다
한여름 수렁논에서 김을 매던
뚝심 깊은 아버지의 팔뚝이 그러했다
논바닥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벼와 벼 사이에서
보호색을 띠며 점령해 오는 피*를 용케도 골라 뽑아내셨다
움푹짐푹한 들녘을 평평하게 펼쳐내는 두 팔
질척한 개흙 속을 훑어 내며 벼 포기들을 퍼렇게 키워냈다
뭉툭하고도 세심한 아버지의 근육
직립과 중력 사이 검붉은 현을 켠다
태엽을 감고 돌아가는 괘종시계처럼 멈추지 않는 아버지의 톱니바퀴 소리
무거운 짐 짊어지고
먼 트레킹 길에 나선 코끼리처럼
농로를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농투성이
아버지 발걸음이 시계추처럼 다시 수렁논을 향한다
중력의 끈은 참으로 질기다.
* 피; 볏과에 속하는 한 해살이 풀
<당선소감>
-
삶이 목마르고 힘들 때는 시의 간 줄기를 물었습니다. 가슴 속 앙금을 씻어 내리는 치료제이고 활력소였습니다. 창작은 삶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주치의 였습니다. 신춘의 언덕에서 가슴 졸이던 어느 날, 남편과 재활병원에 다녀와 늦은 점심을 먹다 당선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마다 시의 농장에는 씁쓰레한 열매가 열렸습니다. 늦가을이면 한해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신춘문예에 응모하곤 했습니다. 결과는 늘 공허했지만 저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춘이 얼마나 치열한 등용문인줄 알면서도 신춘이라는 명찰을 달고 싶었습니다. 오래 전 몇 번의 최종심이 오늘의 끈이 되어주었습니다.
언제나 저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가족들,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굽은 등을 내밀어 주는 엄마 최양자 여사와, 평생을 농부로 살다 가신 가끔 꿈속에서도 포도를 따시는 아버지 황길주씨를 떠올려 봅니다. 시적 스토리가 되는 풍경은 카메라에 담아 건네주는 남편 조영진 씨 내 시의 최초 독자 승재 윤옥 형섭 희정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광의 기쁨을 함께합니다.
문학의 관문에 들어설 때 시안詩眼을 뜨게 해주신 김동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세계를 향하여 먼 바다 항해에 나선 금요시담 선생님들과 순항을 축복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문희, 혜경, 그 외 여러 문우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튼실하게 시의 맥을 이어가라고 동아줄을 엮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열심히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늘 건강한 심신으로 사색하며 신선한 시를 쓰겠습니다. 현시대 삶의 애환을 극복하며 독자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오늘도 시의 밤하늘에 달을 켭니다.
●
<심사평>
“패기보다 시를 오래 쓴 노련함이 엿보인 작품”
우리의 삶에는 어떤 입김이나 손길이 매번 작용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지대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일까?
올해 전북도민일보의 신춘문예를 심사하는 내내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던 생각이다.
올해의 응모작은 대부분이 신춘문예 특유의 톡톡 튀는 사고의 전환이나 새로운 시도는 없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기존의 좋은 작품의 전범을 가져와 작가의 사유를 얹은 듯한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마치 이번 응모작들은 어떤 거대한 손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체에 거른 듯한 느낌이었다. 간혹 몇 작품에서 용감한(?) 시도들이 보이긴 했지만, 정제되지 않은 감정이나 설익은 풍자가 오히려 작품의 격을 떨어뜨릴 뿐이었다.
제목과 내용이 서로를 잘 감당하는가? 시를 통해 존재의 가치를 따뜻하게 보듬는가? 작가가 나름대로 치밀하게 구축한 논리가 시 안에서 무리 없이 잘 완성되었는가? 라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번호를 붙여 보내온 응모작들을 거듭해서 읽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접수번호 31번 ‘중력의 힘’을 최종 선정하였다. 패기보다는 시를 오래 쓴 노련함이 엿보인다. ‘벽시계 추’와 ‘코끼리 코’ 그리고 논에서 김을 매는 ‘아버지의 팔’이라는 세 개의 축이 작품 안에서 솥발처럼 묵묵히 제 몫을 한다. 그렇게 서로에게 잘 맞물리고 스며서 ‘수렁논’ 같은 세상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힘이 생긴다. 특히, 응모한 3편의 작품이 고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샀다. 다만, 너무 많은 직유를 사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작품의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리듬도 늘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마지막까지 경쟁한 접수번호 6번 ‘당신의 시간입니다’에도 박수를 보낸다. 심사한다는 사실을 잊고 위 작품을 읽는 내내 번번이 감동하였다. 당선작을 놓고 여러 번 고민했으나 응모한 3편의 작품이 고르지 못하다는 점이 좀 아쉬웠다. 시를 놓지 말고 좀 더 깊이 사귀시길 바란다.
심사위원 : 김영
<AI와 함께하는 작품 분석>
1) 시의 중심 정리
- 이 시는 “아버지는 힘들게 일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노동이 ‘멈추지 않는 운동’처럼 반복되는 구조를 만들어 보여줍니다. - 그래서 마지막 “중력의 끈은 참으로 질기다”가 단순 감상이 아니라, 앞의 이미지들이 모여 논리처럼 도착하는 결론이 됩니다.
2) 세 개의 축: 시가 ‘솥발처럼’ 서는 방식
심사평에서도 짚었듯, 이 작품은 세 축이 서로를 받쳐요.
① 벽시계 추(리듬/생존의 강제성)
- “끊임없이 움직여야 살 수 있다는 것”
→ 삶의 조건이 “휴식”이 아니라 **운동(움직임)**에 걸려 있음을 선언. - 추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 왕복 운동을 하죠.
즉, ‘자유의 운동’이 아니라 버틸 수밖에 없는 운동입니다.
② 코끼리 코(감지/기술/숙련의 몸)
- 코끼리 코는 “물체를 감지”하고, “바람도 말아 올리는 촉수”예요.
→ 노동을 ‘힘’으로만 보지 않고 감각과 숙련의 기술로 보여줍니다. - “물렁물렁한 살덩이가 때로는 철심처럼”
→ 연약함과 강인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몸.
아버지의 팔도 결국 이 양면성을 닮았습니다.
③ 논에서 김 매는 아버지의 팔(노동/인내/선별의 눈)
- “벼와 벼 사이에서 / 보호색을 띠며 점령해 오는 피*를 골라 뽑”는 장면은
단순 노동이 아니라 **정확한 선별(판단)**의 행위예요. - 여기서 ‘피(잡초)’는 그냥 풀이 아니라, “점령해 오는” 존재로 적대화됩니다.
아버지의 일은 ‘키우는 일’이면서 동시에 침입을 막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세 축이 결국 한 문장으로 묶이죠:
- 추처럼(반복)
- 코처럼(감지/숙련)
- 팔처럼(실제 노동)
→ 이게 합쳐져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삶의 무게)이 만들어내는 운동의 윤곽이 됩니다.
3) ‘태엽’과 ‘톱니바퀴’가 만드는 세계관
이 시에서 반복되는 사물은 ‘자연’이 아니라 오히려 기계예요.
- 태엽 / 괘종시계 / 톱니바퀴
→ 아버지의 삶을 기계적 반복으로 그립니다.
칭송의 미화가 아니라, “멈추지 못함”의 비장함이 생겨요.
그리고 “농로를 터벅터벅” 같은 의성·의태는
기계 이미지 속에 살아 있는 육체의 무게를 다시 얹습니다.
즉, 아버지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4) 좋은 지점: ‘노동의 근육’을 ‘시의 근육’으로 바꾼다
- “직립과 중력 사이 검붉은 현을 켠다”
이 구절이 핵심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직립: 인간이 서는 일(존엄/존재 방식)
- 중력: 인간을 끌어내리는 힘(삶의 무게)
- 그 사이에 ‘현’을 켠다: **버팀 자체가 소리(삶의 음악)**가 됨
→ 노동을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존재의 진동으로 바꿉니다.
'좋은 글 > 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영남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백지와 백기 / 김미희 (0) | 2026.01.19 |
|---|---|
| [2026 중부광역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흰지팡이가 횡단보도를 건넌다 / 공광복 (0) | 2026.01.18 |
| [2026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원탁 / 최은영 (0) | 2026.01.18 |
| [2026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조금 늦었지만 괜찮아 / 연우 (0) | 2026.01.17 |
| [2026 불교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빗물 / 송이후 (0) | 2026.01.16 |

